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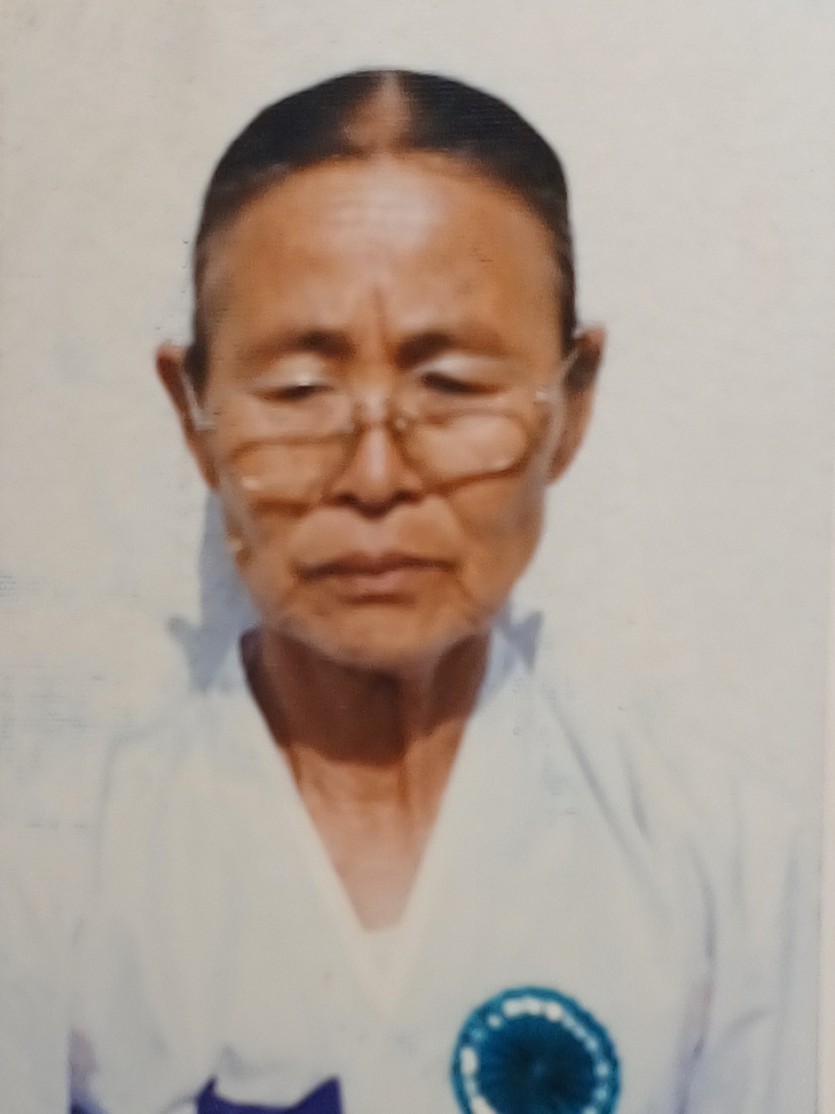
40여년간(餘年間)의 긴 세월(歲月)을 청상과부(靑孀寡婦)로 수절(守節)하면서, 병(病)든 시부모(媤父母)님의 수족(手足)이 되어 온 갸륵한 여인(女人)이 있으니, 그가 효부(孝婦) 이금월(李金月) 여사(女史)이다.
17세(歲)의 어린 나이로 결혼(結婚)한 이여사(李女史)의 남편(男便)은 결혼식(結婚式)이 끝나기가 바쁘게 그 길로 일본(日本)으로 건너갔는데, 곧이어 중환(重患)이라는 급전(急電)을 받고 남편(男便)을 다시 고향(故鄕)으로 모셔 온 후(後) 극진한 병간호(病看護)의 보람도 없이 타계(他界)하는 비운(悲運)을 맞게 되었다.
결혼 후(結婚後) 5년(年)만에 남편(男便)과 사별(死別)한 이여사(李女史)는, 그 애절(哀切)한 슬픔의 눈물도 채 마르기 전(前)에 이번에는 시부(媤父)님마저 암(癌)으로 병석(病席)에 눕게 되는 바람에 시(媤)동생을 비롯하여 시(媤)누이 등 많은 가족(家族)의 살림살이를 도맡게 되는 어려운 역경(逆境)이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
비록 생활(生活)은 찢어지게 곤궁(困窮)했지만, 시부(媤父)님을 위한 그의 극진(極盡)한 간호(看護)는 눈물겨울 정도였다.
그러나 끝내 보람도 없이 그의 시부(媤父)님은 영원(永遠)히 돌아올 수 없는 불귀(不歸)의 객(客)이 되고 말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格)으로 이번에는 시모(媤母)님이 앉은뱅이라는 무서운 병마(病魔)에 걸려들어, 마침내 두 눈까지 실명(失名)하게 되는 액운(厄運)이 겹쳐 이여사(李女史)의 마음을 또 다시 울렸다.
‘그렇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精神)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이여사(李女史)는 이와 같이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대소변(大小便) 뒷바라지에서부터 잠자리에 드는 일에 이르기까지 지성(至誠)으로 봉양(奉養) 했다.
“이여사(李女史)는 병(病)구완을 하기 위해 태어난 천사(天使)같다. 남편(男便)의 병간호(病看護), 이어서 시부(媤父)와 시모(媤母)등 병환(病患)이 단 하루도 그칠 사이 없이 이어졌는데, 이여사(李女史)는 불평(不平) 한 마디 없이 효성(孝誠)을 다 바쳐 간병(看病)에만 일관(一貫)해 왔으니, 그야말로 풍형적(豊型的)인 한국(韓國)의 효부상(孝婦像)이 아니고 무엇이랴!" 인근주민(隣近住民)들의 이같은 찬사(讚辭) 그대로 9년(年)이란 긴 세월(歲月)을 그의 시모(媤母)님을 정성(精誠)들여 봉양(奉養)해 왔지만, 그 역시 보람도 없이 타계(他界)하시고 말았다.
이여사(李女史)는 결혼생활(結婚生活)이 5년(年)이기는 했지만, 단 이틀 밤도 남편(男便)과 잠자리를 같이해 보지 못했을 정도로 독수공방(獨守空房)의 40여년간(餘年間)의 장구(長久)한 세월(歲月)을, 시댁(媤宅)을 위해 희생(犧牲)해 왔으니 근래(近來)에 보기 드믄 효부(孝婦)요, 열녀(烈女)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여사(李女史)는 그 후 양자(養子)를 맞아들이는 것으로 만족(滿足)하면서, 오늘의 역경(逆境)과 고난(苦難)을 내일(來日)의 희망(希望)으로 알면서 살아가고 있다.
양자(養子)를 맞아들인 이여사(李女史)는, 그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행상(行商)으로 고등학교(高等學校) 교육(敎育)까지 마치게 했고, 온갖 품팔이로 결혼(結婚)까지 시켜 오늘날에 와서는 손자(孫子), 손녀(孫女)들의 재롱 속에서 40여년간(餘年間)의 긴 악몽(惡夢)을 회상(回想)하면서 안락(安樂)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이전글제29회 독행상(篤行賞) 김교선(金敎仙) 25.06.09
- 다음글제29회 독행상(篤行賞) 장명출(張命出) 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