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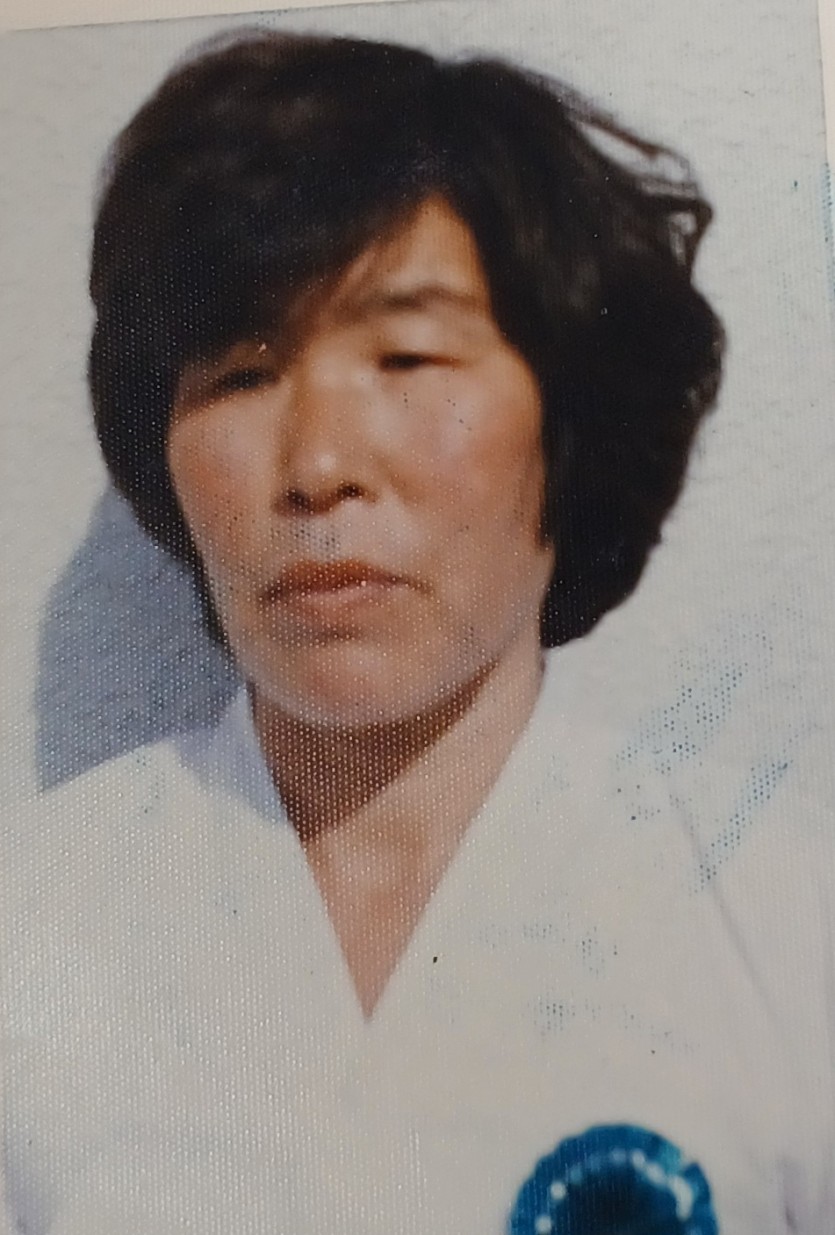
장금옥(張錦玉) 여사(女史)는 21세(歲) 되던 해에 결혼(結婚)했는데,시댁(媤宅)에는 그 때 노시부모(老媤父母)님을 비롯해서 시(媤)누이, 시(媤)동생 등 자그마치 일곱 식구(食口)가 전답(田畓) 한 평(坪)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장여사(張女史)는 결혼(結婚)이 곧 고생(苦生)길이었을 만큼 찢어지는 가난을 행복(幸福)으로 씹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던 중, 1953년(年)부터는 시부(媤父)님의 지병(持病)이 악화(惡化)되어 남편(男便)은 직장(職場)을 그만두고 고향(故鄕)인 영주(永州)로 왔으나, 배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약(病弱)한 탓으로 노동(勞動)도 할 수 없어, 부득이(不得已) 장여사(張女史)가 가장(家長) 아닌 가장(家長)이 되고 이어서 행상(行商)길에 나섰다.
행상(行商)을 끝내고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는 시모(媤母)님을 위해서 고등어 한 마리라도 사들고 들어오는 정성(精誠)을 보이기도 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남편(男便)은 끝내 저혈압(低血壓)으로 병상(病床)에 눕게 됐지만 입원(入院)할 형편(形便)도 못되어 민간요법(民間療法)으로 치료(治療)를 했다.
저혈압(低血壓)에 좋다는 약초(藥草)를 캐기 위하여 산중(山中)을 헤매기도 했고, 물고기와 개구리를 손수 잡아다가 탕(湯)을 끓여 대접하는 등, 나름대로 정성(精誠)을 쏟아서 극진히 간호(看護)를 했지만, 병세(病勢)는 점점 악화(惡化)되어 갈 뿐이었는데, 병원(病院)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으며 1979년(年) 3월(月) 마침내 별세(別世)하고 말았다.
그런데 남편(男便)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前)에 이번에는 또 79세(歲)의 시모(媤母)님이 노환(老患)으로 쓰러져 장여사(張女史)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서 장여사(張女史)는 2남(男) 4녀(女)의 자녀(子女)와 시모(媤母)님 등 부합(附合)여덟 식구(食口)의 연명(延命)을 위해 행상(行商)도 하랴, 시모(媤母)님 간호(看護)도 하랴,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더욱이 시모(媤母)님의 병(病)은 노환(老患)이어서 그가 곁에 있을 때는 손수 대소변(大小便)을 받아내었지만, 그가 없을 때는 기분(氣分) 내키는 대로 방뇨(放尿), 방분(放糞)하는 바람에, 장여사(張女史)는 먼 곳까지 행상(行商)을 떠날 수가 없어 항상(恒常) 인근(隣近) 마을을 헤매다가 집으로 달려와 온갖 궂은 일은 처리(處理)하곤 하였다.
그의 지극(至極)한 효성(孝誠)에 자녀(子女)들도 감화(感化)되어, 지금에 와서는 장여사(張女史)가 집을 비울 때는 자식(子息)들이 할머니 간호(看護)를 대신(代身)하는 등, 그 어머니에 그 자녀(子女)들이라고나 할까 자랑스러운 '효자가족(孝子家族)'으로 성장(成長)해 가고 있다.
“부모(父母)님이 생존(生存)해 계실 때 직접(直接) 효도(孝道)할 수 있는 기회(機會)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世上)에서 가장 행복(幸福)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장여사(張女史)는 시부(媤父)님께 못다한 효성(孝誠)을 시모(媤母)님께 바치기 위해 오늘도 꼬박 시모(媤母)님 곁에 지켜 앉아서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등, 그의 효심(孝心)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 이전글제29회 독행상(篤行賞) 이영자(李榮子) 25.06.09
- 다음글제29회 독행상(篤行賞) 이재술(李再述) 25.06.09